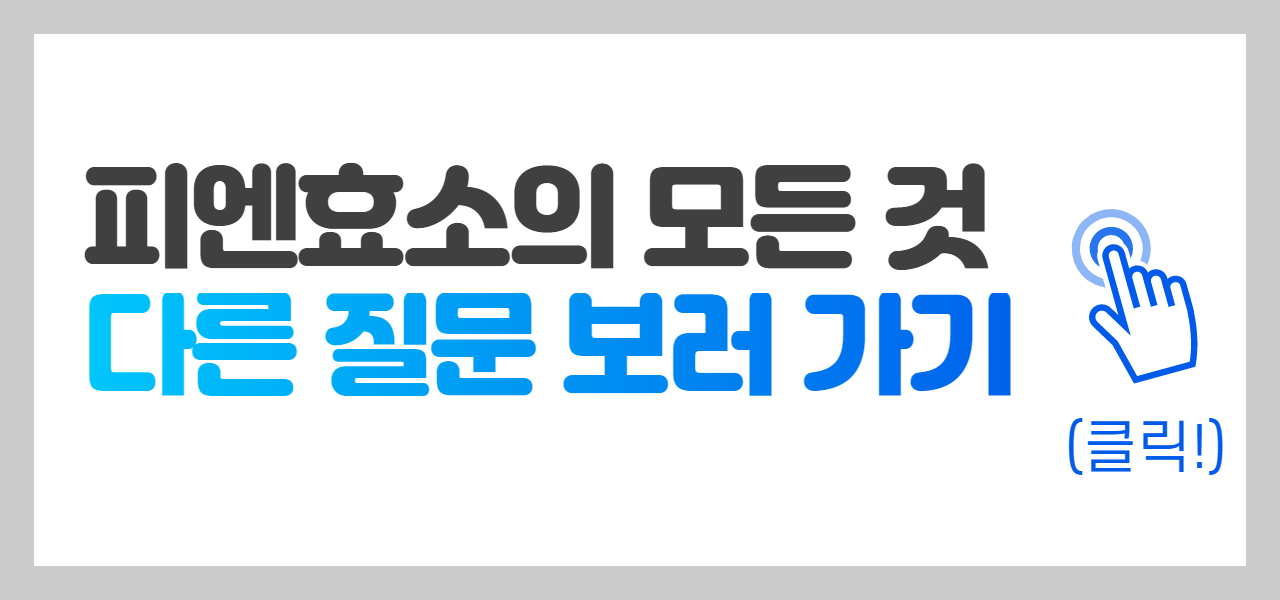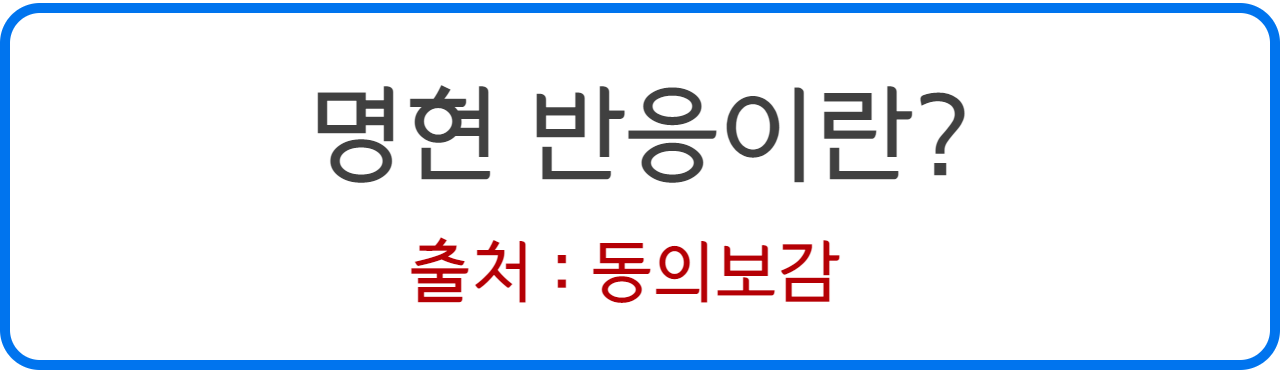
명현반응이란 약을 먹거나 침을 맞았을 때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머리와 눈이 흐리고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면서 가슴이 답답한 병증”을 말합니다.
고대 경서의 하나인 <서경』>에서 “만약 약을 먹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라고 한데서 유래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토한 뒤 정신이 혼미하거나 어찔해지더라도 놀라거나 그 효과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참 황당했습니다. 그건 부작용 아닌가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치료는 무조건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의료사고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빨리 멈추어야 하는 것도 있고, 서서히 가라앉는 것도 있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병도 생로병사를 합니다. 약은 이 시간성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병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면 그것들이 여러 마디를 동시적으로 넘어감으로써 통증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병의 뿌리를 뽑을 길은 없습니다.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웬만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알아채요. 살기 위해서 아픈 것인지, 아니면 별 상관없는 증상인지를 말이죠.
사실 전혀 몸을 쓰지 않다가 처음으로 등산을 하거나, 요가를 하면 온몸이 다 쑤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습속들과 싸우느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명현반응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현반응은 도처에 있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할 때의 쓴맛 역시 일종의 명현입니다. 쓴맛은 일단 괴롭기 때문입니다.
술담배를 끊을 때도, 초콜릿을 끊을 때도, 쇼핑과 게임을 끊을 때도, 반드시 아파야 합니다. 이 아픔은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현명한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고질병일수록 이 과정은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병은 내 몸과 외부의 기운이 어긋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일단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다는 건 내가 내 몸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과 의사는 도우미일 뿐, 치료는 전적으로 환자의 몫입니다.
어디 병뿐일까요. 인생사 전체가 그렇지 않은가요? 통과의례나 성장통, 그리고 연령별 주기마다 찾아오는 문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번뇌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망한 노릇도 없습니다. 미봉책으로 피하고 나면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여 문득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마취나 진통제가 발달해도 통증 자체를 없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창조되면서 질병이 탄생했듯이, 질병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동시에 통증이 없는 삶 역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겪어야 할 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노해의 시 「건너뛴 삶」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처럼 말이죠.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쓸쓸한 미소이건
회한의 눈물이건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담요에 싸서 버리고 떠난 핏덩이처럼
건너뛴 시간만큼 장성하여 돌아와
어느 날 내 앞에 무서운 얼굴로 선다.
병과 아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건너뛴 시간만큼 숙성하고 또 숙성하여 어느 날 문득 마치 괴물처럼 내 몸을 덮칩니다. 결국, 병이건 삶이건 이치는 간단합니다.
아파야 낫는다. 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출처: <동의보감> /고미숙